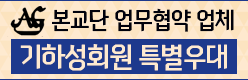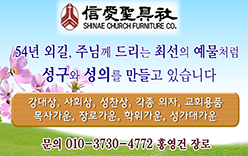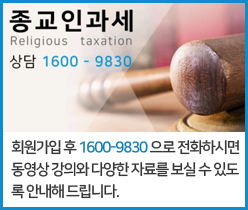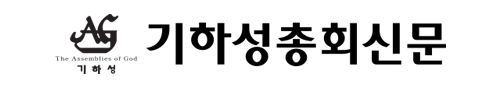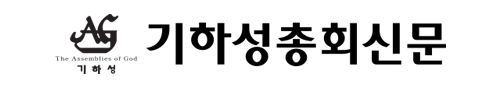현대 설교의 흐름(ⅩⅩⅨ)
조지훈 교수(한세대학교 설교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정 작성일25-08-12 08:52본문
성경의 내러티브성에 주목한 한스 프라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해석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 강조해

설교자라면 누구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길 소망한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 철저한 원고 준비, 준비된 원고의 정확한 전달 등등 설교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 이론과 방법론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교 이론을 소개하고 설교 방법론을 제시하는 글을 연재한다. 목회 일선에서 오늘도 설교 준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찰스 캠벨(Charles L. Campbell)의 Preaching Jesus: The New Directions for Homiletics in Hans Frei’s Postliberal Theology(『프리칭 예수: 한스 프라이의 탈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학의 새 지평』, 이승진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한스 프라이(Hans W. Frei)의 신학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프라이의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프라이가 성서의 중요성과 성서를 해석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학자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는 성경이 가진 ‘내러티브성’(narrative)에 주목한다. 프라이가 말하는 성경의 내러티브성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성경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말하기 위한 상징적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과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저작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프라이가 사용하는 표현이 “역사-같은”(history-like)이다(Hans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221-222). ‘역사-같은’이란 말은 성경, 특히 복음서의 내용이 2천 년 전 실존했던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복음서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역사비평학자들처럼 성경 외적인 사상이나 방법론을 통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프라이의 성경읽기가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 본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으려던, 다시 말해 성경 본문을 하나의 지시체로 생각해, 이 지시체가 가리키는 성경 외부의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내에서 성경 본문이 지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했던점이다. “그 내러티브의 지시대상은 텍스트 밖의 세계가 아니라 그 내러티브 자체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이다”(석종준, “한스 프라이의 내러티브 이론”, 302). 결국 프라이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프라이의 내러티브적 성경 읽기에서 주목할 것은 ‘문자적 독서’ 또는 ‘문자적 의미’이다. 문자적 독서란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문자적 독서가 이야기의 사실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기계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의 ‘실제적인 세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읽기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문자적 독서는 독자의 경험이나 신학적 교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구조와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며 의미를 발견하는 읽기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숨겨놓은 보자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읽기는 역사비평학자들의 성경 읽기다.
성경의 의미는 성경의 이야기가 자체에서 발견된다. 신학적 개념을 찾기 위해 이야기의 구조를 분해하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가 드러내는 진리를 발견하려는 것이 문자적 독서의 핵심이다. 또한 문자적 독서는 해석자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 해석자 자신을 복속시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세계를 해석자의 세계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세계가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에 복종하는 것이다. 폴 리쾨르의 말처럼 텍스트가 해석자를 해석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후기자유주의 신학자 중 하나였던 프라이는 해석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그의 입장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과 예일대 동료였던 조지 린드벡의 문화-언어적(cultural-linguistic) 종교 이해와 맥이 닿아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있다”(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43)라고 말한다. 어떤 언어가 드러내는 의미는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린드벡은 종교라는 것이 개인의 내면 체험을 표현하거나 객관적인 종교적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삶과 의미를 형성하는 문화적-언어적 틀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종교에서 말하는 개념들, 예를 들어, ‘은혜’, ‘죄’, ‘구원’과 같은 개념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며, 교회 공동체에서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 역시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자적 의미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교회에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Hans Frei, Types of Christian Theology, 15). “텍스트의 의미가 공동체 내재적이라는 것이며, 공동체의 언어 사용법에 좌우된다는 것이다”(석종준, 305).
프라이는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현존이란 에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 “예수의 현존을 소유한 자는 신앙 안에 있는 자”이며 이렇게 예수의 현존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다.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그 말씀에 근거해 선포되는 설교와 예수님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례전의 자리를 통해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라이의 신학 방법론은 역사비평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했고 성경의 내러티브성과 그 내러티브가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집중하게 했다. 또한 성경의 의미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해석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